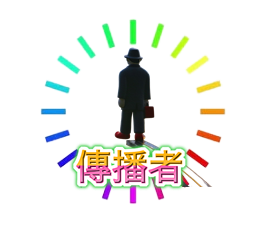- 유튜브
- 뮤직필드
- 마이웨이
- 중앙악기
- 악기바다
- 김일용아코연구원
- 古代文学 > 四大文学名著
- 古代文学
- 红楼梦
- 미인송마을
- 漢詩속으로
- 문학의만남
- 씨비리대지
- 이쁜편지지
- 만남의광장
- 코스모스화원
- 송교수중국어
- 동영상TV영상
- 한국네티즌본부
- 이석화색소폰
- 녹수청산
- 연변방송
- 마담의크스카페
- 커피향영상천국
- 마당발
- 중국어를배우자
- KBS우리말겨루기
- 장미가족포토샵
- 남한산성자연사랑
- 백천문학
- 여민락
- 트로트가요방
- 아코디언사랑
- 이철수아코디언
- 아코디언동호회
- 아코디언친구들
- 삼산종합사회복지관
- 하얀그리움
- 씨비리강토이야기
- 문학의만남
- 아코디언전문카페
- 아코디언초가삼간
- 아코디언유람선
- 강릉아코디언
- 구미아코디언
- 음악과영화
- 아코디언고향
- 원주아코디언
- 춘천아코디언
- 경주아코디언
- 대전아코디언
- 수원아코디언
- 천안아코디언
- 의미의공간
- 씨비리강통의이야기
- 삼산주민기자단
읽고 쓰는 재미, 즐겁게 느껴 봐, 깨닫는 앎, 재미 쏠쏠해!
글이란 읽기는 쉬워도 쓰기는 어렵다 본문
글이란 읽기는 쉬워도 쓰기는 어렵다

글이란 생각을 임의로 적는 것이다. 글을 보고 읽고 느껴 봐, 깨닫는 앎, 꽤 즐겁다. 아무렴, 그런데 글 읽기는 쉽지만 정작 쓰려면 어렵다. 하니 선인들이 가르치는 삼이(三易)에 대해 알아보련다.
삼이(三易) 문장법에서, 보기 쉽게, 쉬운 글자로, 읽기 쉽게 짓는 세 가지 조건을 말한다. 이는 학문을 전수하는데 나오는 말이다. 남에게 전할 수 없는 진리이나 학문은, 진리가 아니고 학문이 아니다. 하문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즉 삼이(三易)이다.
1. 읽기 쉬워야 한다.
2.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3. 전달하기 쉬워야 한다.
주옥같이 귀하고 심오한 진리가 담긴 내용의 글도 한문으로 적은 한문 문집은 우선 일기가 힘들어 인반 사람들과 거리가 멀다. 삼이(三易)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경(佛經)이나 유경(儒經) 등은 그 내용은 심오해도 우선 일기가 힘들어 일반에게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누구든 글을 쓸 때는 이 삼이(三易)를 늘 마음에 두고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장을 쉽게 짓는 세 가지 방법. 보기 쉽게 쓰고, 쉬운 글자를 쓰며, 읽기 쉽게 쓴다.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읽기 쉬워야 한다는 뜻으로, 문장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을 이르는 말이다.
즉 문(文)은 ‘글월, 무늬’ 등의 뜻으로 쓰는 한자이다. 이 글자는 떡 버티고 선 사내의 가슴에 그려진 문신을 상형한 것이라 한다. 문신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가슴에다 그림을 그리던 관습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천문(天文)은 하늘의 무늬이다. 하늘에 있는 별자리의 알롱달롱한 무늬가 천문(天文)이다. 문사(文士) 문호(文豪)같은 말은 글이나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분들은 예로부터 문장삼이(文章三易)라 하여 세 가지 면에서 글을 쉽게 쓰는 분들이다. 요즈음도 논술이니 작문이니 하고 글쓰기가 문제가 되는 때라 문장삼이(文章三易)를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세 가지란 글을 알기 쉽게 써야하고, 글자가 어렵지 않은 것을 골라 써야 하며 읽어서 쉽게 이해되도록 써야 한다는 것이다.
문방사우(文房四友)는 선비의 서재에 없어서는 안 될 네 가지 물건을 의인화하여 일컫는 말이다. 종이, 붓, 먹, 벼루 이 네 가지이다. 한자로는 지(紙), 필(筆), 묵(墨), 연(硯)이라 쓴다. 회사후소(繪事後素)라는 말이 있다. 다소 어려운 말이다. 회사(繪事)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말한다. 후소(後素)는 바탕(素)이 마련된 뒤에 한다는 말이다.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바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림은 그 바탕에 그린다는 말이 된다.
문방사우(文房四友)가 모두 긴요하지만, 그 중에 붓의 역할이 큰 듯하다. 좋은 붓은 네 가지 덕(德)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즉 첨(尖), 제(齊), 원(圓), 건(健)이다. ‘첨’이란 붓끝이 날카롭고 흩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며, ‘제’란 굽은 털이 없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원’이란 보기에 원만한 모양을 지니고 회전이 잘 되는 것을 말하며, ‘건’이란 충실한 선이 꾸준히 그어지며 붓의 수명도 긴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붓의 사덕(四德)이다.
구문(口文)이라는 말도 있다. 구전(口錢)과 비슷한 말이다. 입으로 번 돈을 말한다. 고상함으로 주로 쓰이는 문(文)이 동전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한자교육국민운동 대표)
다시 말해서 삼이(三易)란 문장을 쉽게 쓰는 세 가지 조건, 곧 보기 쉽게 쓰고, 쉬운 글자를 쓰고, 읽기 쉽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문장삼이(文章三易)
이견사 易見事 : 보기(읽기) 쉽게 써야한다.
이식자 易識者 : 알기 쉽게 써야한다.
이독송 易讀誦 : 외기 쉽게 써야한다.
다문다독다상량(多問多讀多商量) -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며 많이 생각함> / 삼이(三易) : 문장을 쉽게 짓는 세 조건; 1. 보기 쉽게 2. 쉬운 글자로 3. 읽기 쉽게 씀, 삼이【三易】: 글을 쉽게 짓는 세 가지 방법. 곧 보기 쉽게 쓰고, 쉬운 글자를 쓰며, 읽기에 쉽게 쓴다. 글 속에 이런 대목이 있다. '문장은 모름지기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읽기 쉬워야 한다...' 즉, 문장삼이(文章三易)다. 매끄럽지 않아 수더분한 글, 마음 놓고 대하기 쉬운 글, 어딘가에 알맹이가 있는 글... 나에겐 기나긴 숙제다. 오늘도 귀촌일기를 쓰면서 숙제를 풀고 있다.
글쓰기에서 정말 심각한 잘못은 낱말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쉬운 낱말을 쓰면 어쩐지 좀 창피해서 굳이 어려운 낱말을 찾는 것이다. 그런 짓은 애완동물에게 야외복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애완동물도 부끄러워하겠지만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은 더욱더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엄숙히 맹세하기 바란다. '평발'이라는 말을 두고 '편평족'이라고 쓰지는 않겠다고. '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똥을 누었다' 대신에 '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생리현상을 해결했다'고 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똥을 눈다' 는 말이 독자들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대변을 보았다'고 써도 좋다('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응가를 했다'도 괜찮겠다).- 스티븐 킹, 유혹하는 글쓰기 中
요즘 상 받았다는 시를 보면, 무슨 놈의 시가 그렇게 어려운지. 소설도 그렇고. 어려운 글은 심오한 글이 아니라 못쓴 글이야. 근데 사람들은 어렵게 쓰는 걸 좋아해. 난해하게 써야 존경을 하지. 내 글은 쉽고 술술 넘어가는데, 그걸 가볍다고 해. 사실 돌아온 사라도 최대한 쉽게 가려고 몇 번을 고치고 고친 거야. 우리나라는 작가들이 문장으로 독자를 고문하고 있는데도, 그걸 존경해. 쉽게 말해서 한국 독자나 비평가들은 마조히스트야. - 마광수
어렵고 교묘한 말로 꾸민 글이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문장의 재앙이다. 글이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쉽고 간략하게 써야 한다. - 교산 허균
시작수업(詩作修業)의 정석(定石)
글쓰기에 관한 명쾌한 지침을 들라면 중국의 문인 구양수(歐陽修)가 말한 삼다주의(三多主義)를 꼽는다. 삼다는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이다. 처음에는 남의 좋은 작품을 많이 읽어서(多讀) 시의 묘리를 체득하고, 스스로 많이 지어서(多作) 표현의 기능을 확장 시킨 다음, 많이 생각해서(多商量) 작품의 세계를 깊게 해야 비로소 시인으로 서서 훌륭한 작품을 짓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따로 ‘삼이주의(三易主義)’ 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공자의 제자인 안자(顔子)의 말인데 문장은 쉬운 말로(易字) 쉽게 써서(易書) 읽기 쉽게(易讀)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오늘날의 詩作에 딱 들어맞지 않는바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배격할 일은 아니다. 글을 쓰는 일차적 목적이 남에게 읽히는데 있다면 써서 독자 대상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세상에는 난해시(難解詩)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고도의 비유(譬喩)와 상징(象徵)때문에 생기는 부득이한 현상이지만 시작 태도는 가급적 쉬운 말로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빈 양철통이 더 시끄럽다고 얼핏 보면 무슨 대단한 내용이라도 담긴 것 같이 어렵게 쓴 시는 대개 양파처럼 껍질을 벗겨 가다보면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다. 시의 이상적인 양태(樣態)는 심오한 사상과 밀도 짙은 정서를 쉽게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쉽고 어려움은 내용면의 차이이어야지 표현면 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친김에 삼구(三究)와 사사(四寫) 오산(五刪)도 살펴보자. 삼구의 ‘구(究)’란 탐구를 뜻한다. 시인은 현상(現象)을 현상 그자체로서 수용(受容)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①사물의 근본을 탐구하고(究本) ②이법(理法)을 탐구하고究理 ③아름다움을 탐구(究美) 해야 한다. 생명을 포함해서 삼라만상은 하나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어떤 리듬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다. 시인은 형안(炯眼)으로 그 질서를 파악하고 그 리듬을 감지해야 한다.
사사의 ‘사(寫)’란 표현을 말하는 것이다. ‘예술은 표현’이므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 작품의 사활을 좌우한다. 표현은 다음 네 가지의 기본 태도를 요구한다. ①순수한 것을 표현하고(寫純) ②진실을 표현하고(寫實) ③성실하게 표현하고(寫誠) ④새롭게 표현해야(寫新) 한다. 시는 시 이외의 그 무엇이어서도 안 된다. 시가 시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에 쓰이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시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진실만이 표현의 대상이 된다.
예술은 창조요, 창조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시인은 소재(素材)나 제재(題材)나 주제(主題)에 있어서 과거에 없었던 것을 찾아내어 표현해야 한다. 시조가 비록 전통적인 정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름의 독특한 리듬과 개성을 살려야 한다. 일반적 경향이나 유행 따위를 모방하고 답습하는 것은 벌써 창작 정신에 어긋난다.
오산은 퇴고에서의 오산인데 ‘산(刪)’은 ‘깍을 산’이다. 한번 이룬 작품에 손을 안 댄다고 하는 이가 있는데 이는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 이런 태도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이다. 손톱만큼의 불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집요하게 깎고 깁고 다듬어야 한다. 거기에 만일 다음과 같은 것들이 눈에 띄면 사정 두지 말고 깍아 내야 한다. ①추잡한 것을 깍고(刪醜) ②저속한 것을 깍고(刪俗) ③거짓을 깎고(刪僞) ④난삽한 것을 깍고(刪澁) ⑤부질없는 것을 깍아야(刪漫)한다.
시는 아름다운 것이어야 하고 고아(高雅)한 것이어야 한다. 이 때 추잡한 것이나 속된 것은 통속적 관념의 그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상념은 되도록 심오하고 정서는 되도록 내밀해야 하지만 표현은 되도록 쉽고 수월해야 한다. 시는 압축된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군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조사(助詞) 하나라도 꼭 놓여야 할 것이 아니면 잘라 내야 한다. (감상)
능곡 이성보/현대시조 발행인
시조 작품 〈맷돌이후〉는 신종만 시인의 작품으로 3수 연작으로 맷돌의 어제와 오늘을 읊은 서정시조다. 시인은 얼마 전 시조작품 〈장날〉을 통하여 잊혀져가는 우리의 풍정風情을 정감 있게 보여 주었기에 그런 시각으로 감상했다.
첫 수에선 추석전날 어머님과 숙모님이 손잡이를 마주잡고 맷돌을 돌리는 정경을 묘사했다/ 우둘툴 암수 맷돌 한가운데 박힌 쇠심/은 우주의 한 중앙이다. / 곡물 먹는 밥통인가 어처구니 휘어 지네 / 란다. 어처구니가 휘어질 정도로 쉼 없이 도는 맷돌이다. 그 돌아가는 모양새를 / 와송이 목마를 타듯 휘모리로 잘도 돈다 /로 표현했다. 종장이 佳句다.
둘째 수엔 / 팥 갈아 죽을 쑤고 콩 갈아 두부 빚네 /라고 하였으니 맷돌은 팥이며 콩이며 마다하는 곡물이 없다. / 둥글넓적 위아래가 천상의 궁합이라 / 함은 위아래의 찰떡궁합을 두고 하는 표현이다. 이를 일러 和音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터. 눈 여겨 볼 부분은 / 골고루 갈리는 한세상 어처구니 있었다 / 이다. 어처구니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 골고루 갈릴 수밖에.
셋째 수엔 맷돌의 오늘을 읊었다.
그 옛날 잘도 돌아가던 맷돌이련만 이제는 / 무대의 뒷전으로 밀려난 맷돌 한 짝 /이다.
/변화의 그늘막에 실어증 앓으면서 / 고즈넉하게 놓여있다. 무슨 말을 하리오. 골동품으로 쳐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한 시절 영화의 꿈을 반추하고 있었다 /는 찡한 서글픔을 안겨주는 종장이다. 밥통처럼 곡물을 먹어대던 맷돌, 이제는 추억만 반추하고 있었다. 그 서글픔이라니.
민속관에 가보면 명패를 앞에 둔 맷돌이 놓여있다. 골동품으로의 신분 상승인데 왠지 초라해 보인다. 무엇이던 제구실을 해야 당당히 보인다. 밥통은 밥만 축내고 제구실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맷돌은 곡물을 주는 대로 먹어제끼는 밥통으로 표현하였음을 재미있는 표현이라 하겠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어처구니가 휘어지겠는가 말이다.
와송은 바위솔이다. 돌아가는 맷돌에서 날리는 가루들이 마치 와송이 목마를 타는듯하다는 싯귀는 참신한 발상이다. 휘모리장단은 자진모리장단 보다 빠르게 몰아가는 장단을 일컫는다. 휘모리로 잘도 돌아가는 맷돌, 신바람이 절로 인다. ‘어처구니’는 맷돌을 돌릴 때 쓰는 나무 손잡이다. 한편으론 궁궐의 지붕위에 올리는 동물 모양의 흙으로 만든 인형을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엔 어처구니가 있다는 말보다도 없다는 말이 쓰이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너무나 엄청나서 기가 막히다’라는 뜻이다.
/ 골고루 갈리는 한세상 어처구니 있었다 / 는 공평하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바라는 시인의 희원이지 싶다. 바로 어처구니 있는 세상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믹서기에 밀려난 맷돌,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 이런지도 모를 일이다. 반추는 되새김이다. 늘그막엔 추억을 먹고 산다. / 한 시절 영화의 꿈을 반추하는 / 맷돌처럼 말이다.<능곡시조교실 제공>
위의 묵직한 실례를 반추(反芻)해 볼 때 삼이(三易)의 삼법으로 글쓰기란 실로 어렵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글은 문장이요, 문장은 없던 것을 새로 다듬어 내는 나만의 개성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쓰기 앞서 우선 우리말의 명수가 되어야 한다. 아름답고 고유한 우리말, 그 속에 삼이(三易)의 비결이 묻혀있어 우리가 개발하고 창작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寶鑑---創作談'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미지(Image)의 힘과 이미저리(Imagery)에 관해서 (2) | 2024.06.17 |
|---|